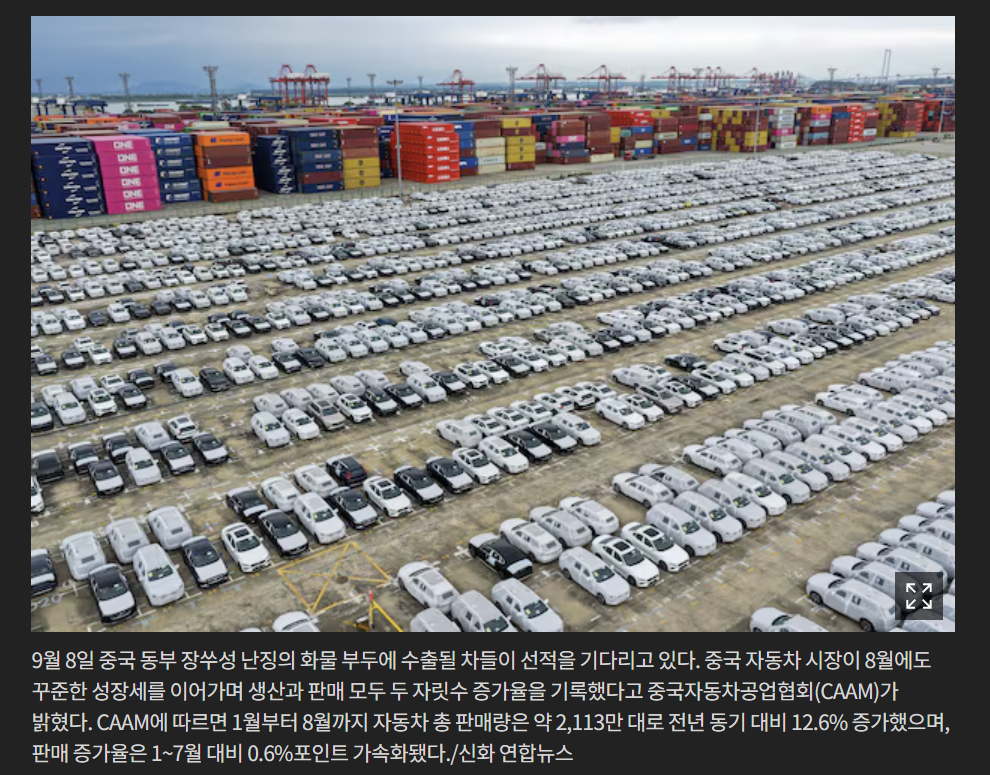
기사 원문
누군가는 더 높은 방어벽을 쌓자고 한다. 누구는 중국과 결별하자고 한다. 하지만 높은 벽이나 외면으로 막을 수 있는 쓰나미가 아니다. 쓰나미 위에 올라타 파도를 탈 수 있다. 세계 경제 질서의 근본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한 어쩌면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
중국엔 ‘우리가 아는 규칙’이 통하지 않는다. 서구식 자유시장 경제가 ‘민간의 효율성’을 금과옥조처럼 여길 때, 중국은 공산당 국가 권력이 민간과 한 몸처럼 움직이며 가공할 속도와 효율성, 창의성을 만들어냈다. 한 기업이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공산당이 다른 기업에 나눠 준다. 기업은 그걸 받아들인다. 이것이 성취욕, 창의력을 훼손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으로 유도하고 있다.
배터리 산업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 기술 우위를 과대평가해, 저가 기술로 치부하던 중국의 LFP 배터리를 외면했다. 그 결과는 중국에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내준 것이다. 조선업 역시 범용 선박부터 잠식해 들어온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었다. ‘차이나 쓰나미’ 시대에 중국의 전략과 시장의 본질을 읽지 못한 탓이다. 값비싼 교훈이다.
한 엔지니어는 웬만한 분야에서 세계 10대 대학을 꼽으면 7~8개가 중국에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계는 이미 중국에 따라잡혔다”고 했다. 기업들이 주목하는 전 세계 과학 논문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쏟아져 나온다. 10년, 20년 뒤는 더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눈을 감고 걷는 것과 같다.
국 천하가 된 글로벌 중저가 시장을 뚫기 위해 중국의 압도적인 가성비를 우리 브랜드와 기술력에 접목한 것이다. 중국의 힘을 이용해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쓰나미에 올라타기’다. 경쟁자를 협력자로 바꾼 것이다.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시장은 중국과 함께 가고, 시장에서 승리하는 기술(winning tech)은 차별화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중국 쓰나미 앞에 선 우리의 미래는 ‘제조 AI’에 있다. 공정 자동화를 넘어 설계, 개발, 생산, 품질 관리, 공급망 최적화까지 제조 전 과정을 AI가 지휘하는 시스템이다. 중국이 단품 기술은 빠르게 복제할 수 있어도,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녹아든 제조 AI의 복잡한 알고리즘은 단기간에 모방할 수 없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초격차다.
우리는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에서도 앞으로 상당 기간 세계 최대 시장은 미국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사이에서 지혜롭게 앞길을 열어가는 수밖에 없다. 정치만 정상화돼 국익 문제에선 협력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중국의 성공 방정식을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 파도의 힘을 이용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파도가 높을수록 더 멀리 나간다.



답글 남기기